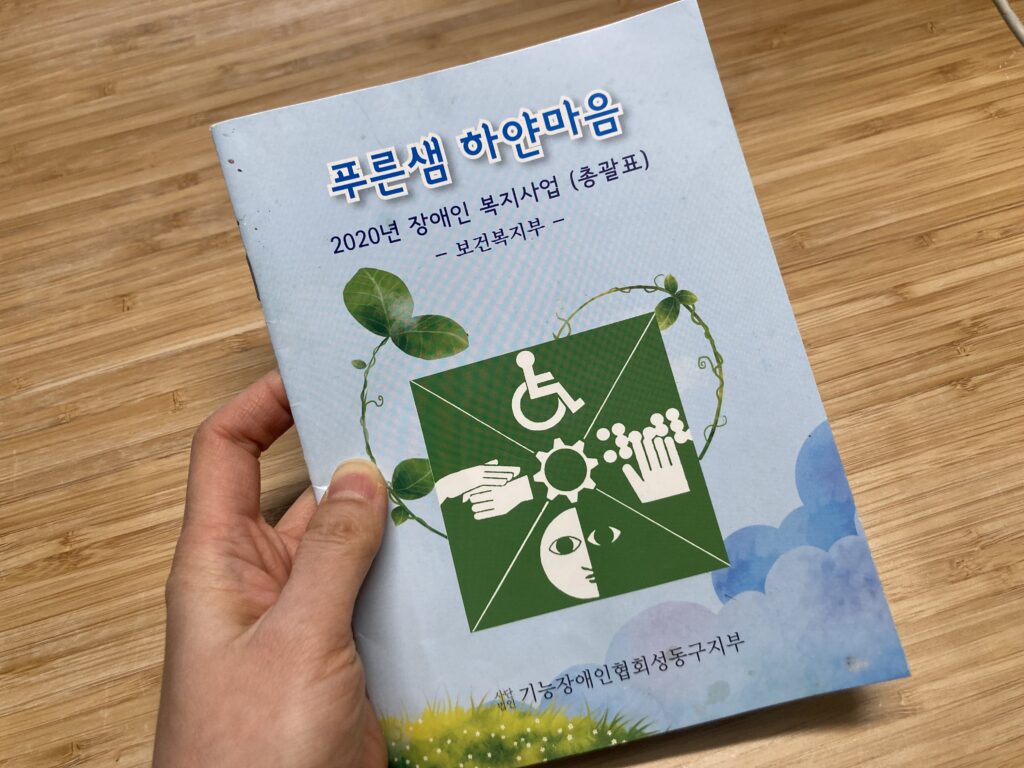글 : 김지영
제하가 경련을 했다. 21년 3월 이후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꼭 3년 만이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뇌에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경련은 피할 수 없는 건가 보다. 단순히 ‘아이가 경련을 했다, 그리고 괜찮아졌다'로 끝나지 않았던, 싱숭생숭했던 그날의 기록.
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에 가쁘게 내쉬는 제하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아이를 만져보니 팔을 흔들고 있었다. 재빨리 불을 켰다. 힘들어하는 표정. 눈은 왼쪽을 흘기듯 보고 있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리며 딸꾹질하듯 일정한 속도로 상체를 흔들었다. 3년 전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새벽에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제하 형을 깨웠다. 내가 호들갑을 떨면 아이도 덩달아 놀랄까 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차분하게 말하고 행동했다. 더군다나 동생이 경련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상황이었다. 내가 제하 옷을 입히는 동안 첫째는 비몽사몽이면서도 군말 없이 자신의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기특하기도 해라.
짐을 싸면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응급실은 몇 번 가봤지만 첫 경련 때는 택시를 탔기에 구급차는 처음 불러봤다. 구급대원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열은 나는지 등 아이의 상태와 주소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면서 구급차가 소방서에서 출발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도록 했다. 기저귀, 약 등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현관을 나서기 직전, 첫째에게 손바닥만 한 장난감을 가져오도록 했다. 응급처치 후 이어지는 각종 검사, 응급실 담당 의사를 비롯한 관련 진료과목 의료진의 방문,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 계속되는 기다림… 응급실에서의 시간은 어른인 나에게도 지루한데 아이는 오죽할까 싶었다.
1층으로 내려갔더니 구급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모차를 가지고 탈 수는 없나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정신이 없던 나는 구급대원에게 멍청한 질문을 했다. 당연히 구급차 안에 유모차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또 했다. “그럼 집에 올라가서 놔두고 와도 되나요?” 구급대원이 시키는 대로 아파트 1층 구석에 유모차를 세워두고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 처음 타보지? 엄마도 처음이야. 우와, 멋지다! 오늘 유치원 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 첫째를 안심시키려고 아무말 대잔치를 열었다. 사이렌 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놀랄까 봐 걱정했는데 구급차 안에서는 왜 사이렌을 안 켜고 가나 싶을 정도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요란하게 달리는 구급차에 길을 내어주느라 좌우로 갈라졌던 차들이 다시 정렬하는 모습이 차창 밖으로 보였다.

첫째는 구급차 안에 있는 것들이 신기한지 연신 두리번거리며 나에게 질문을 해댔다. 아이가 잠시 말을 쉬면 구급대원이 제하의 평소 상태나 질병 이력 같은 걸 물어봤다. 두 사람의 질문에 번갈아 대답하다 보니 얼떨떨했던 내 정신도 또렷해졌고 그제야 영상을 찍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의료진이나 학교, 재활치료실, 돌봄 선생님도 경련 양상을 미리 알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하의 모습을 촬영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처치실로 제하를 들여보내고 첫째와 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소아응급실이라 텔레비전에는 만화가 나오고 있고 동화책과 장난감도 있었다. 만화도 보고 책도 읽어달라고 하기에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경련이 뭐야? 왜 하는 거야?”, ”제하 경련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안 할거란 말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서 경련은 딸꾹질 같은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익숙해질 거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의식이 돌아온 제하가 처치실에서 나와서 진료 구역으로 함께 이동했다. 경련은 멈췄지만 약기운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우리 아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치실에서 석션을 무리하게 했는지 케뉼라와 코로 피가 자꾸 새어 나왔다. 그럴 때마다 첫째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닦았다. 새벽에 일어난 탓에 잠이 모자란 첫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집에 언제 가냐고 칭얼거렸다. 간호사에게 남편이 곧 올 거라고 말하면서 보호자 의자를 하나 더 부탁했다. 의자 두 개를 붙여서 누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만 막상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엄마 같이 놀자!” 그제야 생각났는지 집에서 가져온 장난감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였다. 온몸에 이런저런 줄을 달고 누워있는 제하 옆에서 우리는 알까기 비슷한 놀이를 했다. 놀다 보니 자꾸만 흥분해서 소리치는 아이에게 목소리를 낮추자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편으로는 지루함을 잊은 아이를 보니 다행스러웠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놀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남편이 도착했다.
이 와중에 배가 고픈 나를 원망하며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하는데 첫째도 아빠를 두고 온 나를 원망했다. 제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서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명은 병원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수술하는 거 아니라서 금방 퇴원할 거라고 설명했지만 화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이에게 밥 대신 먹고 싶은 빵과 음료를 직접 고르도록 했다. 이거 다 먹고 소시지도 사 먹자는 말에 활짝 웃는다. 역시, 화났을 땐 맛있는 걸 먹이면 된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진다
늦었지만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입원 짐을 싸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남편이 가져온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보였다. ‘뇌병변 심한장애’라는 글씨가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현타(자기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현실자각타임’의 줄임말)가 왔다. 아, 내 아이가 장애인이구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다 언젠가 봤던 글귀가 생각났다. ‘인생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진다. 그것을 의심하면 괜찮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