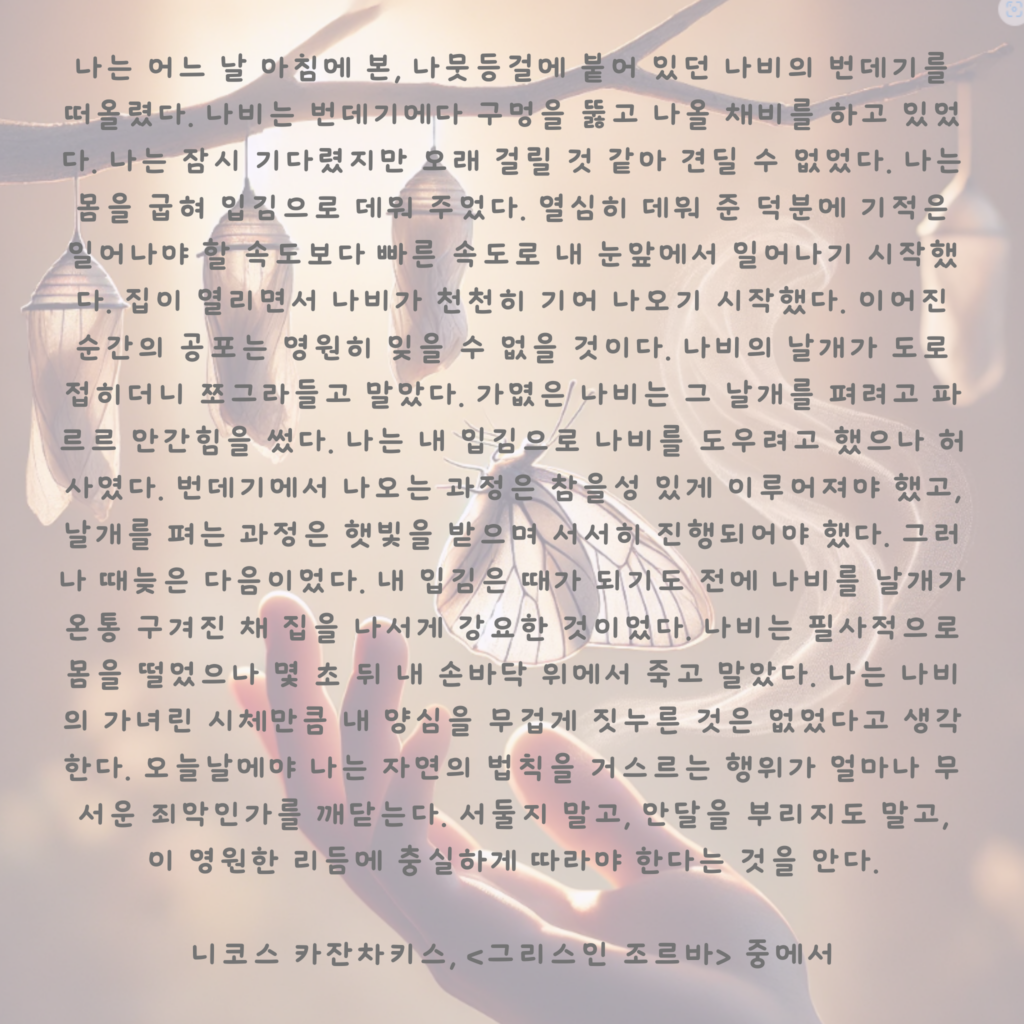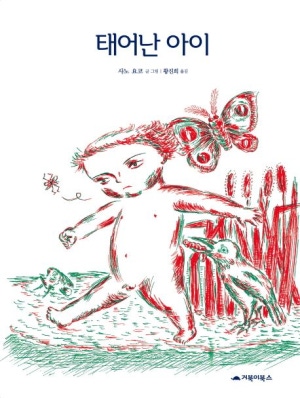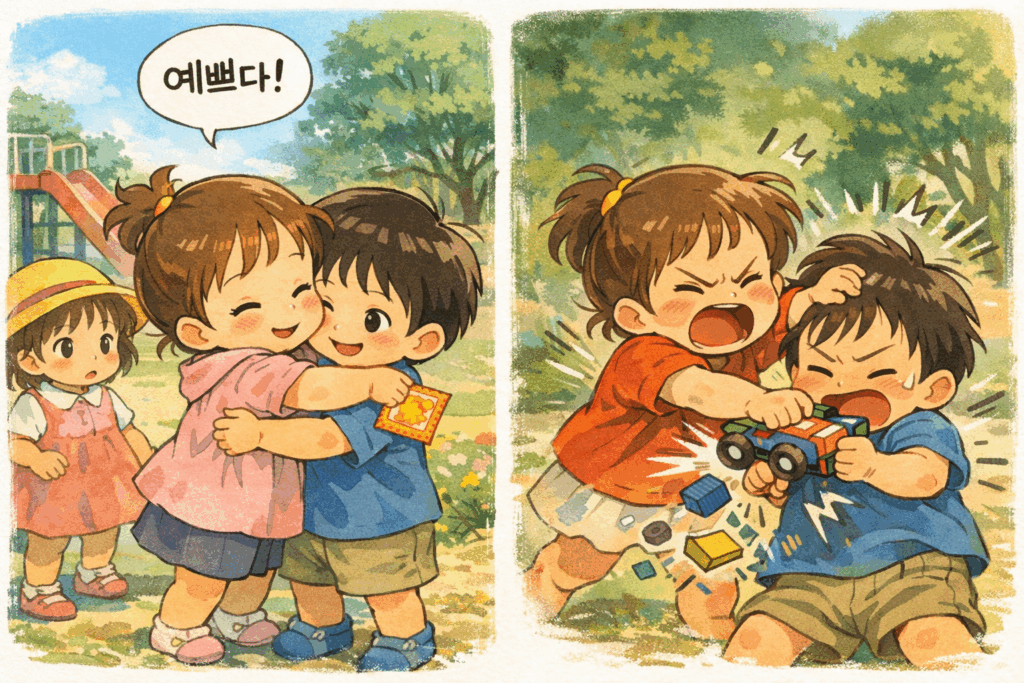글 : 김지영
죄책감 없이, 아이의 속도대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주기
얼마 전 하루 휴가를 낸 돌봄 선생님 대신 제하의 낮 병동 치료실에 동행했다. 거의 1년 만이었다. “제하 어머님이시구나! 어머님~ 제하 말귀 다 알아듣는 거 아시죠?” 그날 처음 마주친 인지치료사가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순간 내 머리를 스친 두 가지 생각. ‘제하가 생각보다 인지가 좋은가 보구나!’ 그리고 ‘그런데도 그동안 내가 너무 방치했구나.’
나는 남보다 아이를 더 모르는 엄마
아이가 오늘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선생님의 말에 놀랄 때가 있다. 특수학교 순회 교사는 제하가 반응을 잘해서 수업할 맛이 난다고 했다. 최근 새로 만난 물리치료사는 제하 움직임이 한주 한주 다르다며 잠재력이 많은 아이라고 했다. 음악 치료사는 심지어 제하와 노래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로 생각했는데 치료 시간에 찍은 영상을 보니 ‘으’, ‘아’ 하는 수준이지만 정말 선생님과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
치료실이나 학교 선생님이 제하에게 새롭고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다 보니 엄마인 나보다 아이에 대해 더 많이 안다. 아니, 어느 정도는 나도 알면서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제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똘똘하고 잘 움직일 수 있는 아이인데 내가 그만큼 뒷받침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저귀 갈아줄 때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입은 꾹 닫고 손만 바쁘게 움직인다거나 나중에 해도 되는 집안일을 굳이 하느라 제하와 놀아주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하가 똘똘하다, 잘하고 있다고 하면 기쁨과 죄책감, 두 가지 양가감정이 몰려오는 것이다.


생각만큼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엄마 마음
보통 엄마들은 열심히 치료하러 다니는데도 변화가 안 보인다며 전전긍긍하는데 나는 반대로 아이에게 기대를 너무 안 했다. 제하가 신생아중환자실을 퇴원할 때 의사가 온통 까맣게 녹아버린 뇌 사진을 보여주며 먹고 자고 싸는 것만 겨우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나는 보수적으로 아이를 돌봤다. 병원에 입원할 일을 만들지 않고 그저 잘 보살피는 데에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렸다.
보통 아기는 전기, 중기, 후기 이유식을 거쳐 일반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제하는 만 5세인 지금까지도 중기 이유식을 먹고 있다. 연하곤란이 있어서 기도 흡인으로 인한 폐렴도 걱정되고 씹는 게 익숙하지 않아 식사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다. 항상 삶아서 간 고기만 먹었던 제하에게 맛이라도 좀 보라며 소금 쳐서 구운 고기를 입에 물려줘 보았다. 밍숭맹숭한 이유식만 먹다가 짭짤 고소하게 기름이 올라온 고기 맛을 처음 본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쩝쩝 소리를 내며 고기를 씹었다. 그런데 고기 한쪽 끄트머리를 잡고 있다가 잠깐 놓친 사이 제하가 고기를 꿀떡 삼켜버린 것이다. 꽤 길쭉하게 자른 터라 목에 걸린 건 아닌지, 깜짝 놀란 나는 하임리히법이 떠올라 아이를 뒤에서 안고 흉부를 압박했다. 그런데 제하는 이미 고기를 잘 삼켜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원래 같으면 헛구역질을 반복하다 토했을 텐데 말이다. 보통 아이들보다 시간이 훨씬 걸리긴 하겠지만, 서서히 단계를 높이면서 씹는 연습을 끈기 있게 시켰다면 제하도 지금쯤 일반식을 먹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론 변명 거리도 차고 넘친다. 일상적인 돌봄만 해도 내겐 벅찬 일이었다. 밥 먹이고 치료실 다녀오고 낮잠 재우고 기립기 세우고 또 먹이고 씻기기만 해도 하루가 다 갔다. 제하 외에 챙겨야 할 쌍둥이 형제도 있다. 그 와중에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했다. 어떤 이유를 붙여 보아도 어쨌든 결과만 두고 보면 ‘안 한 건 안 한 거’니까, 죄책감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다. 누구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지만, 엄마로서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도움을 주려는 타인의 말에도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를테면 치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같은 거다. “집에서 발목 스트레칭 많이 해주셔야 해요.” 물론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자주 해주지 못했다. 아이 발달에 필요한 이런저런 교육을 다녀와도 이론만 늘어갈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게 훨씬 많았다.
아이도 나도, 잘하고 있다
제하는 기관절개관을 하고 있어 평소에는 바람 소리가 나지만 스피킹 밸브를 끼우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처음으로 제하와 긴 대화를 했다. 제하 이름을 부르니 ‘아’하고 대답해 주었다. 우연인가 싶어 거듭 불러보았는데 계속 대답했다. 오늘 치료 힘들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투정 부리듯 ‘으으응~’ 하기도 했다. 제하도 엄마와 소통하는 것이 기쁜 것 같았다. 소리는 ‘으’와 ‘아’가 전부였지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대화를 했다. 느리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우리 아이. 너도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느리다는 이유로 알아봐 주지 않았구나. 기대를 안 하는 것도 채근하는 것만큼이나 너의 속도를 무시하는 것이었구나.



제하가 2년간 다닌 재활치료실에서 최근 의사, 치료사들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다. 제하에게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의사의 말에 제하가 만약 외동이었다면, 내가 제하에게 올인했다면... 아마 지금쯤 목 가누기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집에서 뒷받침을 많이 못 해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이 더 큰 걸 해주셨는데요? 생존에 필요한 케어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제하에게 해준 건 극히 일부예요. 어머님은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한 건 어느 정도일까. 내가 얼만큼 해야 내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엄마라면 아무리 모든 걸 쏟아부어도 후회와 죄책감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 굳이 죄책감을 갖지 말자. 아이도, 나도 잘하고 있다. 그저 아이의 속도대로 성장하는 것을 끈기 있게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할 땐 손 잡아 주자. 오늘은 오래된 소설의 한 페이지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