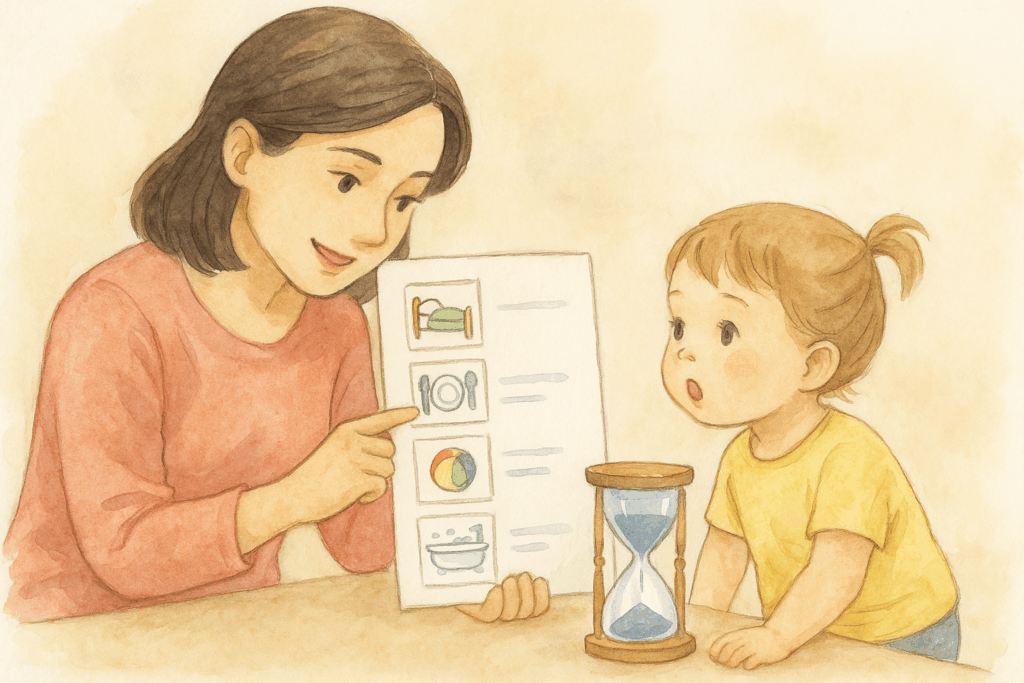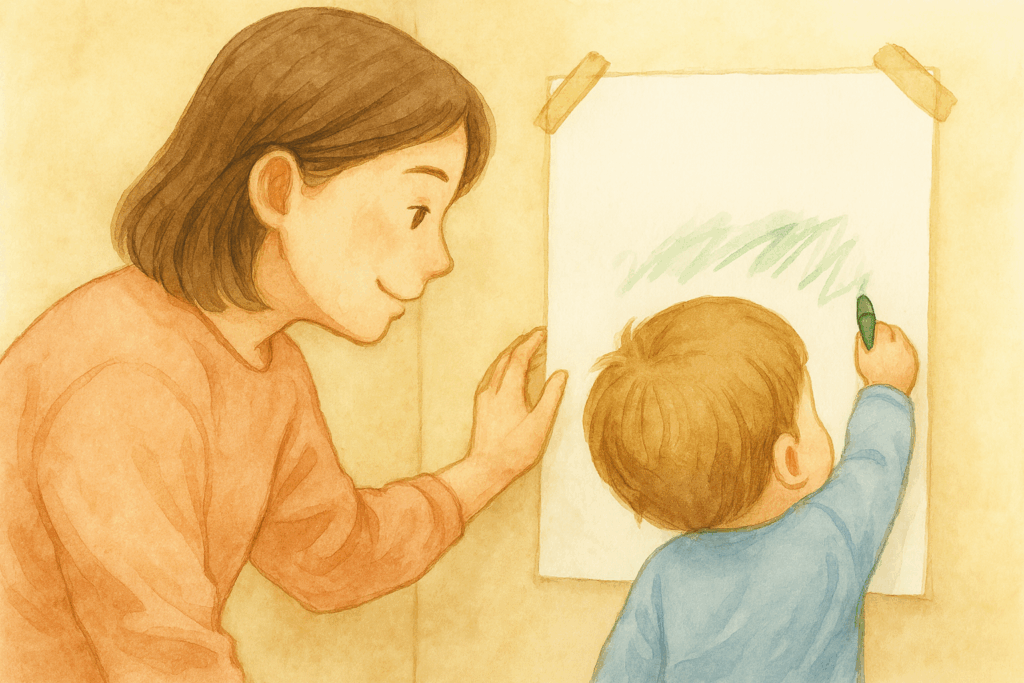글 : 김지영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 꿇는 엄마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다. 그게 2017년이었으니 내가 출산하기 2년 전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얼마 전 나도 같은 이유로 무릎을 꿇게 되었다.
반대하는 주민, 이용하는 정치인
장애인은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가기가 어렵다. 거주지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도보 통학은 언감생심, 차로 30분 이내면 다행이다. 특수학교라고 아무 데나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 수 자체도 적지만 그마저도 지체, 발달, 시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나뉘기 때문에 문은 더 좁아진다.
나는 성동구에서 신혼집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다가 몇 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제하가 특수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는데 성동구는 물론이고 인접 지역에 지체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 애정도 깊었고 오래 살고 싶었지만 학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던 나의 신혼집. 좁고 오래된 빌라에서 넓은 신축 아파트로 옮기는데도 짐이 빠져나간 텅 빈 집을 보니 쫓겨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다.

이사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2029년에는 성동구에도 지체 특수학교가 개교할 거라는 소식이 들렸다. 학교 부지가 신혼집이었던 곳에서 도보 20분 거리로 자주 지나던 길목에 있었다. 제하가 다니게 되진 않겠지만 한때 우리 가족이 살았던 곳에 특수학교가 생긴다기에 기뻤는데, 역시나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년 총선 때 한 후보가 이 부지에 특수학교 대신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시민의식이 예전보단 높아진 건지 해당 후보는 비난 여론에 부딪혀 낙마했지만 그 뒤로도 다른 시설을 유치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들어왔다.
반대는 아니지만, 여기는 아니다?
지난 6월, 교육청에서 개최한 특수학교 설립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반대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힘을 싣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삼삼오오 모였다. 나도 특수학교 재학생의 엄마로서, 한때 성동구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섰다.
명품, 게임, 패션… 글로벌 대기업의 본사가 대거 들어서고 있는 성수동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일 것이다. 학교 부지 맞은편은 대규모 재건축 예정지로, 반대하는 주민 대부분이 그 땅에 집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주민이었다. 설명회장 주변에 걸린 현수막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들의 논리는 ‘명품 동네’에는 그에 걸맞은 ‘명품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너무 그러시지들 마세요.” 설명회 시작 전 교육청에서 나온 관계자가 자리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주민 설명회는 특수학교 설립 찬반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학교 설립은 교육청 권한으로 이미 결정되었다며, 이 자리는 설립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설명회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질문다운 질문이 나왔지만 내용이 점점 반대의견 피력으로 바뀌어가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모두 서로 마이크를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마이크는 공평하게 이쪽저쪽 번갈아 가며 주어졌다.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재건축 예정지로 이사 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일반 학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수동을 비롯해 성동구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규모 중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학교를 통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주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수십 년도 전에 자녀를 학교에서 졸업시켰을 어르신들이었다. 그러니 일반 학교를 지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교육 특구’로 지정된 성동구에 어울리는 명품 특목고를 짓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특수학교 하나 없는 곳이 교육 특구라고 할 수 있을까? 특수학교는 명품 학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인가?
두 번째 반대 이유는 더 좋은 곳에 지으라는 것이었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는 아니다. 이 자리는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도 불편하고 공기도 안 좋고… 서울숲 옆에다 지어라.” 아무리 돌려 말해도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모두가 허울 좋은 핑계일 뿐, 결국은 집값이었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2016년 교육부가 전국 특수학교 주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한 결과, 특수학교와 집값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주변 길을 새로 닦고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눈물 흘리는 부모들
마음을 찔러대는 날카로운 말들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반대 주민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면서 가슴은 두근두근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찬성파’ 한 명이 처음으로 발언을 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 타구에서 소식 듣고 찾아온 특수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과 학부모, 특수학교 교장, 아무 관계 없지만 우리를 지지하러 온 사람들…
“아이고~ 많이도 왔네!” 내 자리 바로 뒷줄에서 반대를 외치던 주민들도 놀란 눈치였다. 그러면서 주민도 아닌 것들이 왜 여기 와서 난리냐고 비아냥거렸다. 애초에 지역 주민 외에 장애인 학부모와 특수학교 설립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참석 대상이라고 공지된 터였거니와 찬성파 중에 성수동 주민도 있었다. 재개발은 아직 멀었는데 10년 후가 될지 언제 입주할지 기약 없는 사람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당장 이 동네에 살고있는 내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다고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했다.

왜 특수학교는 지고 들어가야 할까
특수학교 설립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에 안심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다. 왜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는 하지 않는 주민 설명회를 열어야 하나? 학교를 짓는데 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왜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하나? 특수학교 짓는 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나? 지금 제하가 다니는 특수학교도 보상 명목으로 바로 옆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지어줬다고 한다. 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과 제도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