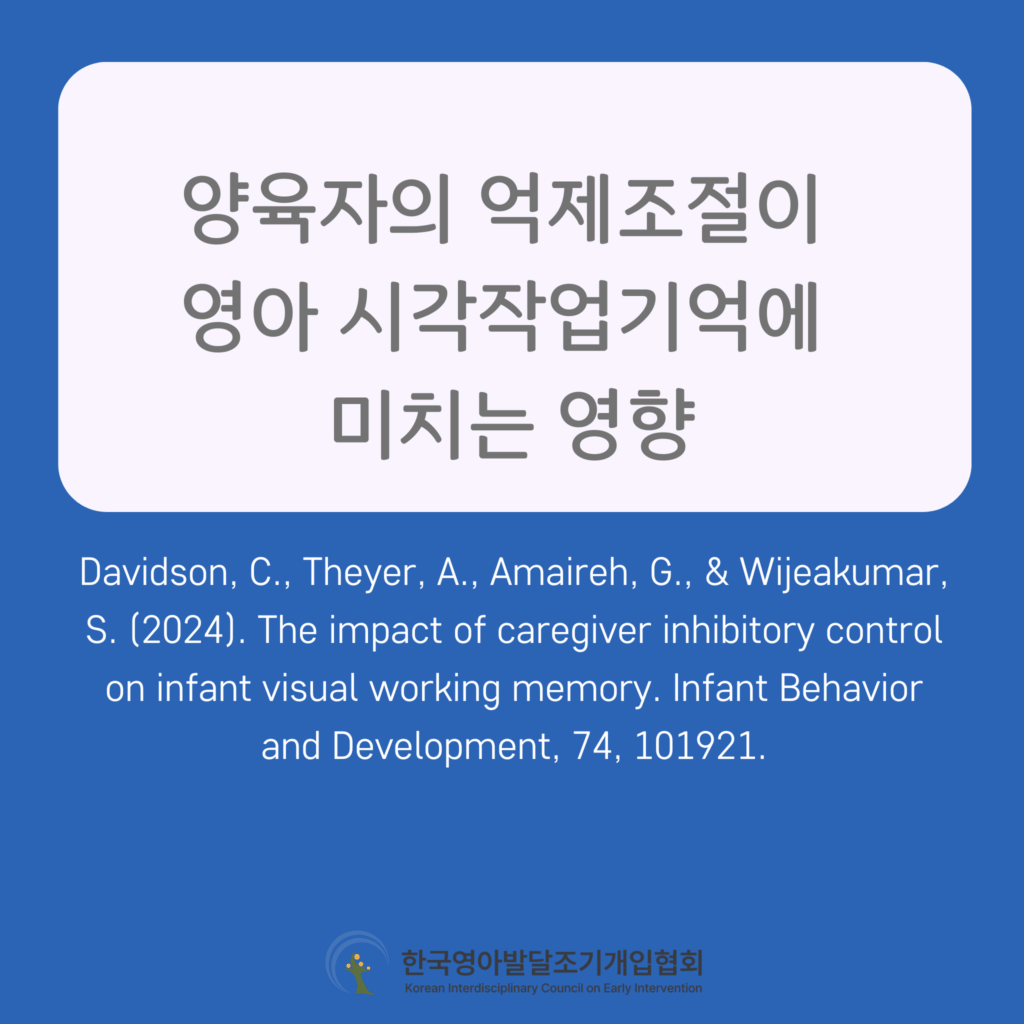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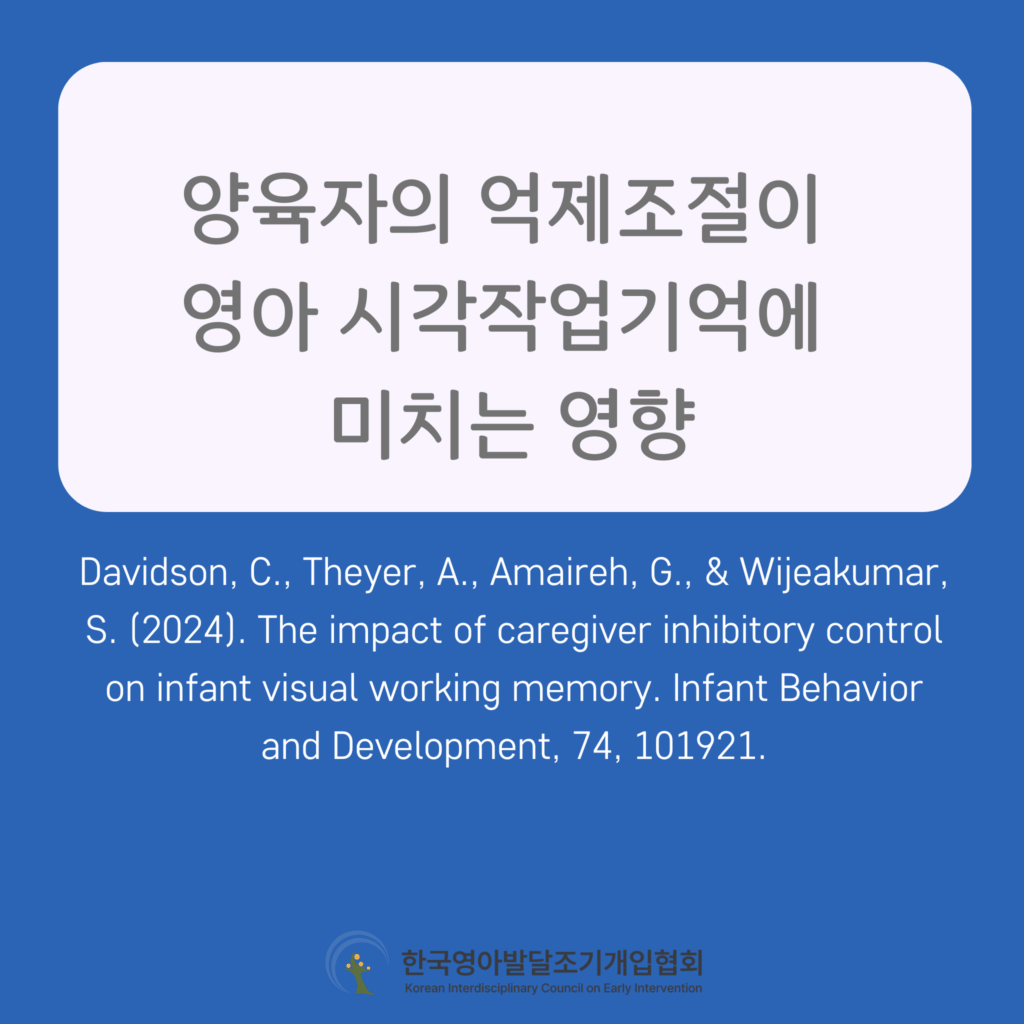
뉴스레터로 협회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닫기
콘텐츠로 건너뛰기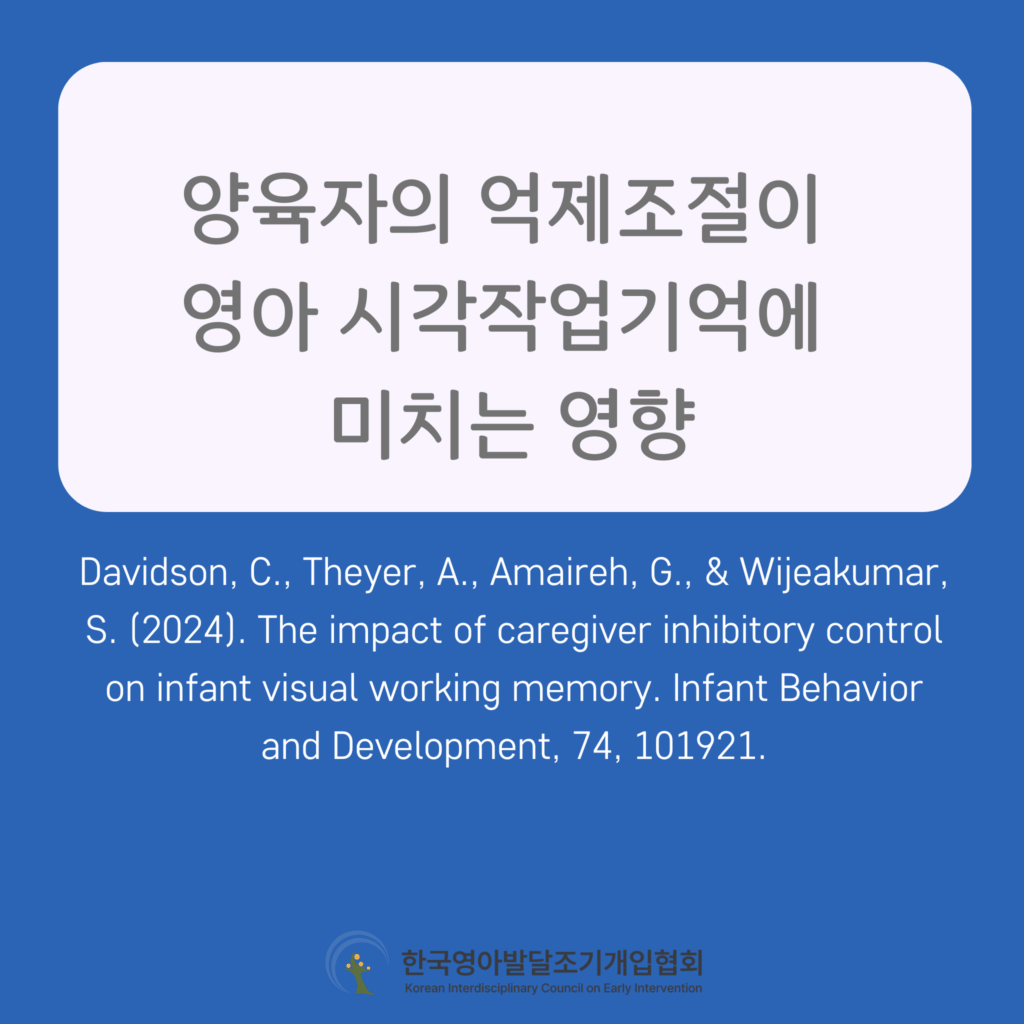
 설계: 양육자 억제조절 효율↔영아 VWM 행동 및 뇌활성 간 연관성 분석. fNIRS 동시 활용.
설계: 양육자 억제조절 효율↔영아 VWM 행동 및 뇌활성 간 연관성 분석. fNIRS 동시 활용. 참가자: 최종 88명의 양육자, 86명의 영아(6–10개월). 다수는 여성 주양육자.
참가자: 최종 88명의 양육자, 86명의 영아(6–10개월). 다수는 여성 주양육자. 양육자 과제: Go/No-Go. 정반응률과 반응시간을 결합한 “효율 점수”(값이 덜 음수일수록 효율↑).
양육자 과제: Go/No-Go. 정반응률과 반응시간을 결합한 “효율 점수”(값이 덜 음수일수록 효율↑). 영아 과제: 선호응시 기반 VWM(부담 1·2·3항목).
영아 과제: 선호응시 기반 VWM(부담 1·2·3항목). 뇌측정: fNIRS(양육자 36채널, 영아 20채널).
뇌측정: fNIRS(양육자 36채널, 영아 20채널). 행동: VWM 부하↑에 따라 영아의 변화측 선호 점수는 낮아졌다. 양육자 효율과 영아 행동 간 직접 연관성은 없었다.
행동: VWM 부하↑에 따라 영아의 변화측 선호 점수는 낮아졌다. 양육자 효율과 영아 행동 간 직접 연관성은 없었다. 영아 뇌: 좌측 중간전두(lMFG), 좌하두정(lIPL)에서 의미 있는 효과. 특히 lIPL에서 “부하×영아 성과×양육자 효율×혈색소” 상호작용. 효율이 낮은 양육자의 영아는 중·고부하에서 성과가 높을수록 lIPL 활성 감소 패턴을 보였고, 효율이 높은 양육자의 영아는 이런 성과-의존 조절이 거의 없었다.
영아 뇌: 좌측 중간전두(lMFG), 좌하두정(lIPL)에서 의미 있는 효과. 특히 lIPL에서 “부하×영아 성과×양육자 효율×혈색소” 상호작용. 효율이 낮은 양육자의 영아는 중·고부하에서 성과가 높을수록 lIPL 활성 감소 패턴을 보였고, 효율이 높은 양육자의 영아는 이런 성과-의존 조절이 거의 없었다. 양육자 억제조절 효율은 영아 행동을 “바로” 바꾸지는 않지만, 주의-기억 네트워크의 사용 방식에 간접적으로 스며든다. 효율이 낮은 환경은 과제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좌하두정 조절이 요동칠 수 있다.
양육자 억제조절 효율은 영아 행동을 “바로” 바꾸지는 않지만, 주의-기억 네트워크의 사용 방식에 간접적으로 스며든다. 효율이 낮은 환경은 과제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좌하두정 조절이 요동칠 수 있다. 이는 양육자의 자기조절이 상호작용의 침습성·혼란을 줄이고, 영아의 지속적 주의 에피소드를 촉진한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이는 양육자의 자기조절이 상호작용의 침습성·혼란을 줄이고, 영아의 지속적 주의 에피소드를 촉진한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표본은 주로 영국, 백인 비율이 높고, 1차 양육자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본은 주로 영국, 백인 비율이 높고, 1차 양육자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코칭 초점 전환: “양육자 억제조절” 같은 하위 기능을 구체 표적화. 가정 내 상호작용에서 주의 분산 단서를 줄이고 차분한 대기·기다리기 루틴을 설계.
코칭 초점 전환: “양육자 억제조절” 같은 하위 기능을 구체 표적화. 가정 내 상호작용에서 주의 분산 단서를 줄이고 차분한 대기·기다리기 루틴을 설계. 세션-중재 연결: 과부하 상황(장난감 많음·소음)일수록 영아의 두정엽 조절이 흔들릴 수 있다. 놀이 환경을 단순화하고, 시각적 표적을 1–2개로 제한한 뒤 난이도를 점차 높이기.
세션-중재 연결: 과부하 상황(장난감 많음·소음)일수록 영아의 두정엽 조절이 흔들릴 수 있다. 놀이 환경을 단순화하고, 시각적 표적을 1–2개로 제한한 뒤 난이도를 점차 높이기. 관찰-피드백: 코치가 3–5분의 “집중 놀이 에피소드”를 녹화·리뷰하며, 양육자의 말 끊기·빠른 과제 전환 빈도를 계량화해 억제조절 전략(숨 고르기, 3초 기다리기, 신호어 사용) 피드백.
관찰-피드백: 코치가 3–5분의 “집중 놀이 에피소드”를 녹화·리뷰하며, 양육자의 말 끊기·빠른 과제 전환 빈도를 계량화해 억제조절 전략(숨 고르기, 3초 기다리기, 신호어 사용) 피드백.  다문화·부·모 참여 확대: 부·조부모 등 2차 양육자도 코칭에 포함. 연구 한계를 보완하는 현장적용 필요함.
다문화·부·모 참여 확대: 부·조부모 등 2차 양육자도 코칭에 포함. 연구 한계를 보완하는 현장적용 필요함. 평가지표: 행동지표만이 아니라, 과제 부하 변화에 따른 영아의 주의 지속 시간, 시선 전환 빈도, 중재 전후 난이도별 성과-의존 패턴을 기록.
평가지표: 행동지표만이 아니라, 과제 부하 변화에 따른 영아의 주의 지속 시간, 시선 전환 빈도, 중재 전후 난이도별 성과-의존 패턴을 기록. 


You can see how this popup was set up in our step-by-step guide: https://wppopupmaker.com/guides/auto-opening-announcement-popups/
You can see how this popup was set up in our step-by-step guide: https://wppopupmaker.com/guides/auto-opening-announcement-pop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