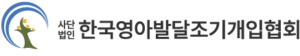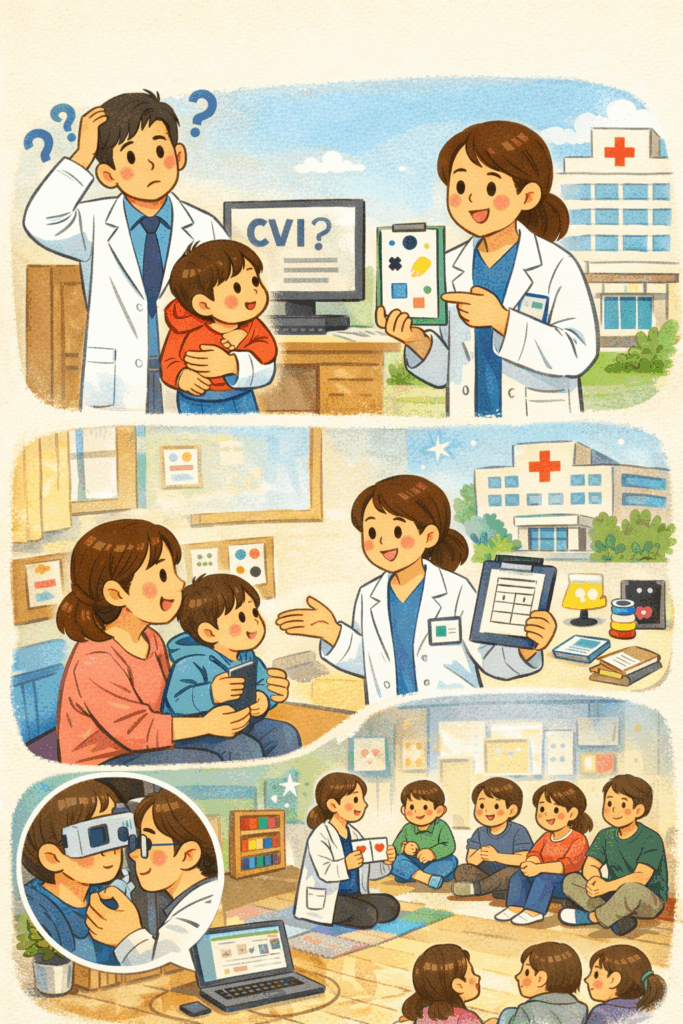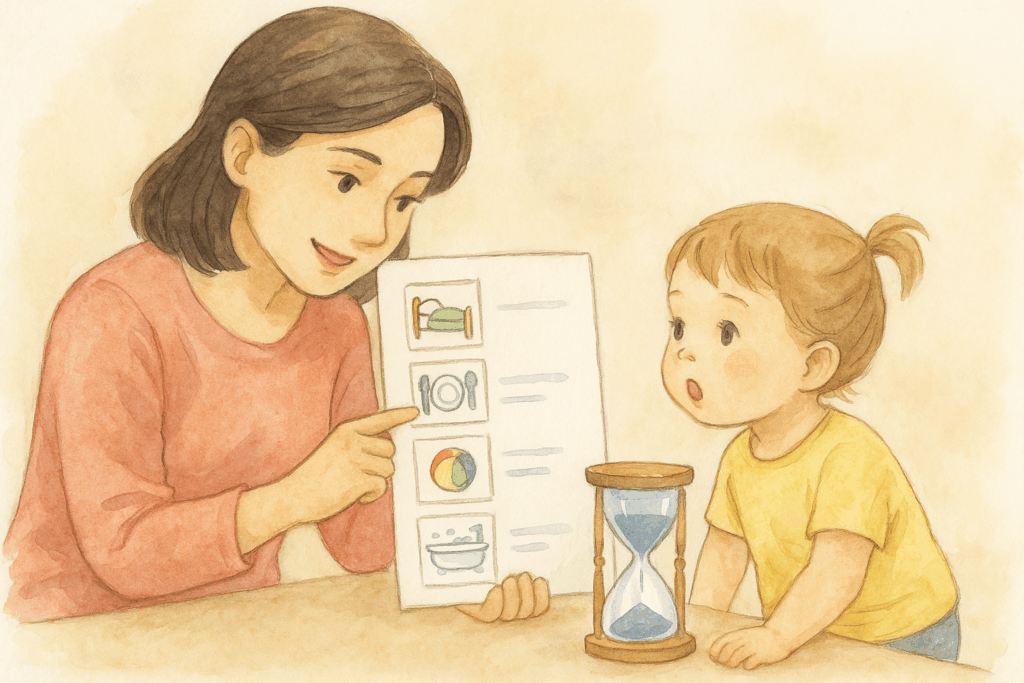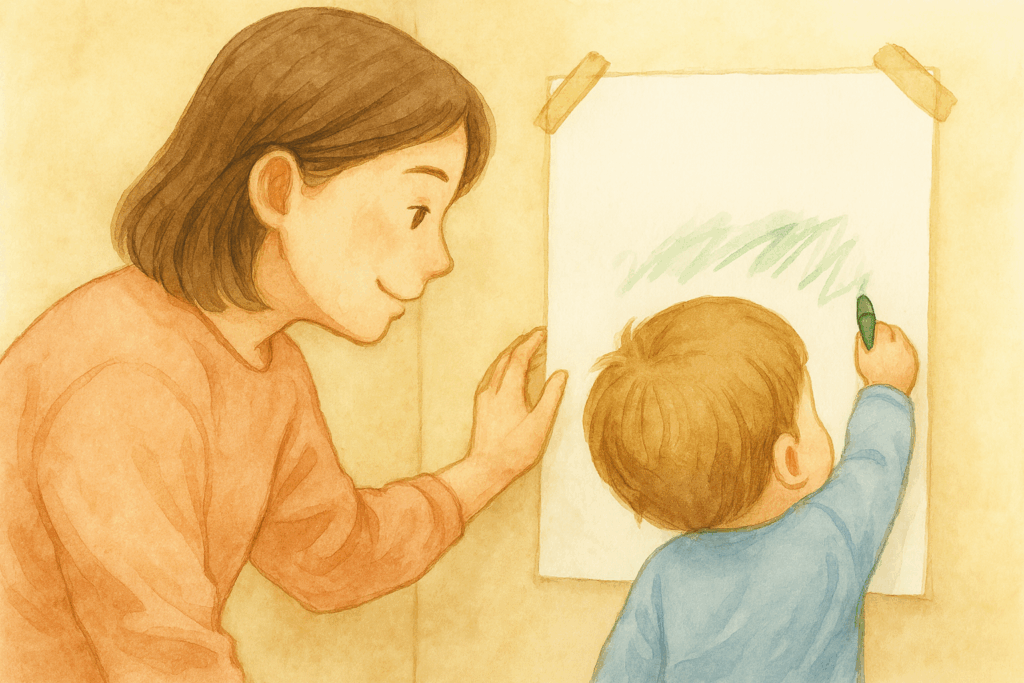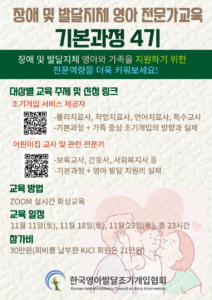글 : 김지영
제하가 학교에 다니고, 나는 자조 모임을 시작하면서 장애인 자녀를 둔 선배 엄마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나는 선배의 말을 아주 귀담아듣는 편이다. “활동지원사? 장애인콜택시? 우리 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아픈 애 키운다고 아파트 몇 채는 해 먹었지.” 복지, 정보 등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불모지였을 시대를 먼저 살아본, 모진 풍파를 몸소 겪은 선배의 말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냥 된 건 없다
그들은 자녀가 성인이 됐음에도 여전히 열정적인 활동가다. 내 아이를 위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돌이켜 보면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사업에 자세보조용구(맞춤형 이너)가 포함된 것이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 비전센터, 뇌병변 마스터플랜 등도 모두 선배 엄마들이 중증장애인 부모 모임을 통해 이뤄낸 것이었다.
후배 부모에게도 장애 자녀의 부모로서 사회활동을 할 것을 권했다. 그 시작점은 학교다.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엄마끼리 뒤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의견을 모아 학교를 상대로 적극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모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학교도 긴장하고 아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학부모회나 학부모위원회에 소속되면 내 목소리를 현실화할 힘이 생긴다는 선배 엄마의 조언에 학부모회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통학 첫해라 어리바리한 학부모였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손만 들면 되었다.
학교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은 힘이 약하기에 장애인 부모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책을 제안할 때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단체로 행동하거나 임원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을 얻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임에 소속되고 부모 활동가가 되면 몰랐던 것을 알 수 있고, 엄마가 많이 알고 요구하는 만큼 많이 누린다.
내 의견을 똑똑하게 현실화하는 방법
중증장애인은 유아동기를 지나서도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크면 밖에서 기저귀를 교체하기란 쉽지가 않다.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일반 화장실은 장애인 유모차가 들어가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제하도 기저귀 갈 곳이 마땅찮아 종종 길 구석에 유모차를 펼쳐두고 기저귀를 교체하곤 한다. 더 크면 남들 시선 때문에 이마저도 할 수 없을 텐데, 화장실 때문에 외출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역시나 성인 와상장애인 자녀를 둔 선배 엄마는 화장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담요로 아이를 가린 상태에서 교체하는데 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서럽고 죄짓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고 했다.